[노명우의 여행으로 쓴다]나폴리의 장례식 종소리 (daum.net)
[노명우의 여행으로 쓴다]나폴리의 장례식 종소리
[경향신문] 관광 그러니까 시각적 쾌락을 목적으로 타인의 무덤에 가본 적 있었던가? 단연코 없었다. 나에게 무덤이란 국립묘지처럼 ‘참배’하거나, 부모님의 묘소처럼 ‘애도’하는 곳이었다
news.v.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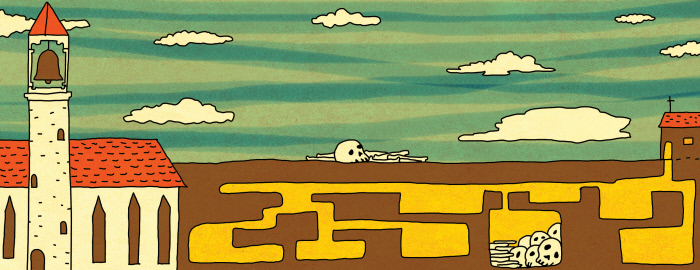
[노명우의 여행으로 쓴다] 나폴리의 장례식 종소리 / 노명우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
관광 그러니까 시각적 쾌락을 목적으로 타인의 무덤에 가본 적 있었던가? 단연코 없었다. 나에게 무덤이란 국립묘지처럼 ‘참배’하거나, 부모님의 묘소처럼 ‘애도’하는 곳이었다. 관광객으로 나폴리에 오니 감히 무덤을 구경하겠다고 나서게 되었다. 관광 안내 책자에서 구한 나폴리의 ‘볼거리’ 정보에 따라 카타콤, 즉 지하무덤을 구경하기로 했다.
개별 관광이 허락되지 않는 곳이다.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서만 구경할 수 있다. 예약을 대행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카타콤을 이렇게 설명한다. “나폴리 지하의 산 제나로 카타콤을 탐험하세요! 나폴리 수호성인 산 제나로와 도시 간 끈끈한 유대감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이 초대장은 카타콤을 다소 경쾌하게 소개하며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혹시라도 지하무덤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예약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도 카타콤이 제공하는 볼거리를 보다 유혹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문장을 읽고 나면 어느새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된다. “시간을 거슬러 나폴리의 수호성인 산 제나로의 지하묘지로 여행해 보세요. 나폴리의 거리 아래로 9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그려진 아름다운 프레스코화와 비잔틴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하묘지로의 ‘여행’, 일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일상에서 불가능한 일을 체험하는 것을 여행의 참맛이라고 느끼는 관광객은 이곳이야말로 여행 온 이유를 설명해주는 최적의 장소라 간주한다. 그리고 구경한다.
그랬다. 그곳엔 구경거리가 많았다. 아무리 지질적인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하 땅굴을 다층으로 판 건축 솜씨는 신기했고, 이곳 저곳에서 발견되는 프레스코 그림은 놀랍기만 했다. 관광객이 기대하는 구경에 대한 모든 욕구를 충실히 충족시키는 곳이었다. 지하세계 ‘탐험’이 끝나고 “지하묘지로의 여행”을 마무리할 때 탐험 여행을 안내했던 가이드가 폰타넬레 공동묘지 방문을 권했다.
전 세계 여행객의 인공지능인 구글 지도를 검색해보니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혹시 한국에 잘 알려진 곳인가 하여 네이버도 검색해봤다. 폰타넬레 공동묘지에 관한 블로그 포스팅이 거의 없다. 그곳에 갈 충분한 이유가 된다. 묘지를 향해 가는 동안 폰타넬레 공동묘지를 페이스북에 포스팅할 생각에 흐뭇했다. 남들이 모르는 나폴리의 ‘진정성’에 독점적으로 가까이 가는 느낌이었다.
폰타넬라 공동묘지는 카타콤과 달랐다. 입구부터 산처럼 쌓인 해골과 뼈 더미와 마주쳤다. 여긴 카타콤의 프레스코 그림처럼 시각적 안정을 유도하는 볼거리가 없다. 해골은 해골끼리, 뼈는 뼈대로 가지런히 분류되어 만들어진 기괴한 군집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1836년에서 37년 사이 당시 인구 35만7000명이었던 나폴리에서 3만2145명이 도시를 휩쓴 콜레라로 세상을 떠났다. 미처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시체가 폰타넬레 공동묘지에 무덤도 만들지 않은 채 쌓였다. 어디에도 이들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표식이 없다. 뼈 위에 뼈가, 해골 옆에 해골이 쌓여 있으나 저 뼈는 어느 해골과 한때 한 사람의 것이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그날 밤 자다 깨다를 반복했다. 잠들어도 해골과 뼈가 꿈에 자꾸 나타났다. 깨어나면 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날 밤 나폴리에서 겪었던 그 불편함의 이유를 17세기 영국 시인 존던의 산문에서 찾았다. “어떤 이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일부다. 만일 흙덩이가 바다에 씻겨 가면 유럽은 줄어들 것이고, 갑(岬)이 그리되어도 마찬가지이며, 친구와 자신의 땅이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죽어도 나는 줄어드니 이는 내가 인류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니 종이 누구를 위해 울리는지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지 말지니, 그 종은 그대를 위해 울리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 매일 뉴스에 숫자로 표기되는 사람, 그 죽음은 구경거리가 아니다. 그 사람을 위해 제대로 울리지 않은 장례식의 종소리, 그 종소리는 나를 위해 울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날 나폴리에서 나를 위해 울리는 3만2145번의 종소리를 들었으니 제대로 잠이 들지 못했던 것은 당연했다.
노명우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ㅣ경향신문 2020.03.24
'[해외여행] 나를 찾아 떠나는 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명우의 여행으로 쓴다] 가지고 다녔으나 보이지 않았던 것들 (0) | 2022.05.09 |
|---|---|
| [노명우의 여행으로 쓴다] 국가대항 ‘코로나 올림픽’이 아니지 않은가 (0) | 2022.05.09 |
| [노명우의 여행으로 쓴다] 이탈리아 나폴리의 소스페소 커피 (0) | 2022.05.09 |
| [노명우의 여행으로 쓴다] 선입견이 견문으로 수정되는 과정, 여행 (0) | 2022.05.09 |
| [여행 News] 100만원 육박 PCR 검사비, 역대 최고 유류할증료.. 해외여행 기대감 발목 (2022.04.29) (0) | 2022.04.29 |